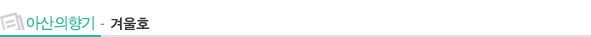|
 명의를 찾아서
명의를 찾아서 |
 ‘태아치료’가 가져다 준 새로운 희망 ‘태아치료’가 가져다 준 새로운 희망 |
최선희 |
|
|
한번 가정해 보자. 뱃속의 아이가 기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출산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실제로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게다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작은 기형을 가진 태아들까지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렇게 스러져 가는 작은 생명들이 못내 안타까웠던 김암 교수는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아산병원에 ‘태아 치료센터’를 열었다. 산전기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구하자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태아치료란 말 그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가진 결함을 자궁 내에서 외과적으로 교정하는 태아수술도 여기에 포함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청이 수술입니다. 요즘은 이런 정도의 기형은 분만 전에 감쪽같이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가 세포들을 자라게 함으로써 수술 흔적도 남지 않아요. 복수가 찬다든지, 콩팥에 물이 차는 증상도 외부에서 관을 넣어 물을 뺄 수 있습니다. 생후에 관을 빼내고 막힌 부분을 이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콩팥이 망가져 출생 후에 아예 떼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는 태아치료가 도입되면서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다며 흐뭇해한다. 지난 92년에도 그는 국내 최초로 ‘양수 주입술’을 도입, 양수가 부족해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태아들을 살려냈다.
“태아들은 양수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먹고, 배설하며 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장기에 기형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성에가 낀 유리창을 보는 듯 불투명하게 보여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기에게 문제가 있어도 발견이 어렵죠. 그런데 미국 연수를 갔다가 인위적으로 양수를 보충해 주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걸 시도하게 된 것이죠.” 양수 주입을 통해 태아의 기형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바로 그 연장선에서 태아치료센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최근 그는 기존 약의 부작용을 대폭 줄인 조기진통억제제를 개발해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거둔 성과로, 임상실험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곧 국제학술지인 ‘브리티시 저널’(British Journal)에 소개될 예정이다.
산과(産科) 의사, 몸은 힘들지만 보람은 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길로 접어든 그는 원래 공대 지망생이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손재주가 좋아 기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인간의 몸보다 정밀한 기계는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공감하며 의대로 방향을 틀었다.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를 물으니 “대학시절 지도교수의 전공과목이기도 했고, 다른 과에 비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미개척 분야라는 데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그동안 임상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의학 분야는 발전이 빠르지만 임신·출산처럼 임상연구가 더딘 분야는 아직도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좀 더 많은 후배들이 여기에 도전해 좋은 성과들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産科)는 해마다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라 솔직히 걱정입니다.”
물론 산과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이유를 그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24시간 내내 응급대기조로 살아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산모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분만상황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그럼에도 그는 ‘몸은 고되지만 보람이 크다’며 산과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결혼 이후 집사람과 약속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호출이 올지 몰라 모임이 있어도 술도 거의 안 하죠.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휴일에도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야 하는 것 때문에 병원 근처에서 이사도 못 가고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허허. 그래도 아기들 울음소리며 건강한 움직임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니, 아무래도 천직인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 같은, 참 따뜻한 의사
근 30년 동안 산과를 지키고 있는 그에게는 재미있는 기억들도 많다. 쉰셋 나이에 아기를 낳고는 ‘너무 창피하다’며 하루 만에 퇴원한 어느 아주머니에서부터, 5.7kg의 우량아를 순산(?)한 산모, 레지던트 시절에 받은 아기가 어느 새 임산부가 되어 그를 찾아온 사연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옛 이야기처럼 쏟아져 나온다.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그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선천적 기형 때문에 세 아이를 모두 포기해야 했던 젊은 부부는 지금도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 임신한 태아마다 양쪽 신장이 모두 없는, 학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희귀한 경우였던 것. 원인 규명을 위해 조직 샘플을 미국으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지만 결국 원인을 알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한 번은 아기 손가락이 여섯 개인, 육손이를 임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초음파를 보다가 무심코 그 얘기를 해 주었더니 다음 달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길로 유산을 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 후로 육손이 같은 경증 기형은 아예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출생 후 수술로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한,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가벼운 기형에도 유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늦은 결혼과 고령임신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세태가 한없이 걱정스럽다. 아기들의 기형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아기를 위한 출산 적령기는 22~24세,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급적 빠른 출산을 권하는 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자신의 손을 거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한다는 김암 교수. 인터뷰 내내 그는 ‘명의라는 말은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지금도 많은 임산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친정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임산부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아기의 탄생 순간에는 마치 친부모처럼 함께 기뻐하고 감동하는 의사.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보다 더한 명의를 찾으라면, 그건 정말 어려운 주문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