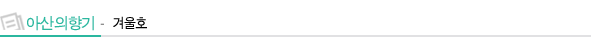|
 명의를 찾아서
명의를 찾아서 |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김기수 교수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김기수 교수 |
공남윤 |
|
|
여기, 천사들이 잠시 날개를 접고 머물러 있다. 하얀 깃털같이 보드라운 몸에 깃든 병마의 그림자가 걷힌다면, 팔 다리에 조금 더 힘이 생기고 지금보다 날숨의 강도가 조금만 더 세진다면, 인큐베이터가 아닌 아늑한 엄마의 품속에 안길 수 있으리라. 이곳에서의 시간은 웃으며 기억하는 추억거리로 고이고이 간직한 채….
아주 작은 몸집의 천사들이 몸을 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이곳에, 숨을 쌔근쌔근 쉬고 있는 아기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가 있다. 지난 1989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며 신생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매진해온 김기수 교수. 귀한 보석을 매만지듯, 투명한 유리그릇을 어루만지듯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하다. 그저 울고 웃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여리고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겨울을 깨치고 얼굴을 내민 봄 햇살 같다. 그는, 남들보다 작고 약하게 태어난 이 아기들이 지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항상 ‘응급상태’예요. 그러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가녀린 몸으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기들. 김기수 교수는 이 천사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 건강한 몸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도록 곁에서 끝없는 지원 세례를 퍼붓는다. 그리하여 인큐베이터를 떠나 가족에게 갈 수 있도록 쉼 없는 도움을 준다.
천사들에게 튼튼한 날개를 달아 주기 위해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기들을 포기하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느 정도 키우다가 자식이 아픈 경우 애착을 갖지 않는 부모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신생아들은 아직 정이 들지 않은 자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지요.”
오랜 시간을 살 부비며 키운 자식과 달리 신생아에 대해서는 뱃속의 아기를 유산시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는 것. 그런 부모들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면, 그에게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럴 때면 먹구름이 층층이 덮인 듯 마음이 캄캄해진다. 자신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물론 뱃속에 있는 열 달 동안 생긴 사랑으로 진한 모성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세상 빛을 보자마자 사지로 내몰린 천사들의 단단한 바람막이가 되고자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그리고 건강하게 살이 차올라 방긋 웃으며 가족의 품에 안기는 아기들의 맑디맑은 모습이 그로 하여금 지난 16년 여의 시간을 같은 결로 살게 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보호자가 생각나요. 집안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수술비가 없어 애타하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어 라디오방송에 사연을 소개했지요. 후원금으로 3,000만원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였는데 수술을 하고 기적적으로 건강해졌어요. 퇴원하는 날, 아기 엄마가 저희에게 300만원을 내밀더군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신생아 중환자실의 대부분은 미숙아들이다. 달수를 채우고 나오지 못한 아기들은 의료진의 사랑으로 커가며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한다. 그의 손길로 건강을 되찾았던 갓난아기 중에는 벌써 중학교 3학년으로 훌쩍 큰 아이도 있다.
“일년에 500~600명의 아기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1,500g 미만의 아기들도 100~110명쯤 돼요. 신생아 중환자실은 항상 응급상태인 데다가 인력에 여유가 없다 보니 의사들도 당직을 섭니다. 다들 고생이 많지만 아기들 얼굴 보면서 시름을 잊지요.”
그를 비롯해 피수영·김애란 교수와 45명의 신생아실 간호사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천사들이 튼튼한 날개를 달고 무사 귀가할 수 있도록 팀플레이를 펼친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원은 의료진을 향한 보호자들의 믿음이다.
오직 한 꿈, 그것을 이루며 사는 행복 그의 삶의 방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해져있었다. 소아과의사인 15년 터울 누나의 영향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소아과의사를 꿈꾸었다. 계획했던 것보다 몇 배 더 작은 아이들을 맡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일찍부터 정한 삶의 물줄기를 따라 잘 흘러온 셈이다.
소아심장전문의가 되고자 했던 그에게 신생아 전문의의 길을 권유한 것은 소아과학의 권위자인 서울의대 홍창의 교수. 미숙아로 태어나 여느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졸업생’들을 보면 그때의 선택에 더욱 자신이 붙곤 한다. 그가 누이를 보며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처럼 맏딸은 그의 뒤를 이어 의학도의 길로 접어들었다. 힘들다고 푸념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자신이 느끼는 보람과 행복을 딸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겐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지금의 제 일이 말이에요. 아주 작아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아기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의 얼굴에서 희로애락을 찾아온 김기수 교수. 그를 비롯한 신생아 지킴이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호된 출생신고식을 치르는 천사들을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신생아중환자실은 병약한 신생아를 위해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들로 인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울아산병원의 신생아 사랑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그는 2008년 4월 개관 예정인 센터에 대해 국내 신생아 중환자실 중 단연 ‘최고’일 것이라고 귀띔한다. 멋진 인테리어에 최첨단 장비를 구비할 것이라지만, 그보다 더 듬직한 것은 김기수 교수와 같은 의료진이 있어서다. 유난히 약한 몸으로 세상에 온 이 땅의 천사들을 지켜주는 그가 있기에 신생아실의 아기들은 오늘도 세상과 반갑게 인사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