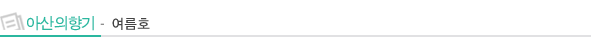|
 명의를 찾아서
명의를 찾아서 |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이기업 교수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이기업 교수 |
박미경 |
|
|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말하자면, 그는 ‘불량취재원’에 가깝다. 마치 상대방을 애먹이기로 작정한 사춘기소년처럼, 의도적으로 그는 종종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비껴간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올해 쉰 살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우리나이로 쉰 한 살이라고 굳이 고쳐주고, 만으로는 쉰 살이겠다고 다시 말을 건네면 생일이 안 지났으니 마흔아홉 살이라고 끝내 비껴간다. 서른과도 다르고 마흔과도 틀린 ‘쉰의 향기’에 대해 물으려던 계획이, 쉰이라는 나이 자체를 거부하는 그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실망하긴 아직 이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연구의 늪을 오랜 시간 헤매온 사람에게서, 언제 나을지 모르는 환자들의 곁을 오랜 세월 지켜온 사람에게서 ‘소년의 장난기’를 발견하는 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주는 재미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을 덮어주고도 남는다.
‘현장’의 샘에서 ‘연구’의 물을 긷다
이야기가 연구나 치료 쪽으로 넘어가면 그는 돌연 장난기를 거둔다. 당뇨병 전문 의사로서 ‘알파리포산’이라는 비만억제물질을 개발, 각종 매스컴을 장식한 것이 작년 이맘 때.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할 때의 그의 얼굴은 이제 소년의 그것이 아니다.
“알파리포산의 비만억제효과에 처음 주목한 게 99년이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당뇨병치료기술을 개발했는데, 쥐에게 10여 가지 약물을 투여하던 중에 우연히 알파리포산을 투여하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물질이 식욕억제효과와 에너지소비촉진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를 밝혀내는 데 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연구실의 불을 함께 밝혀온 동료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이죠.”
말이 5년이지,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더듬 헤쳐나간 ‘인고’의 시간이었다.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기를 수차례, 세 번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여가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관련논문이 실리던 날의 감동을 그는 잊지 못 한다. 그 감동이 단순히 저명잡지에 논문이 실렸다는 기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당뇨대란’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자신들의 연구가 당뇨와 싸우고 있는 400여만 명의 환자들에게 ‘파란신호등’이 돼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의사들이야말로 신약개발을 비롯한 질병연구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수백수천의 환자들을 직접 돌보면서 얻는 수백수천의 데이터들은 단순히 ‘책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와 함께 해야만 환자를 위한 ‘진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에, 세상이 주목하는 알파리포산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그는 결코 환자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당뇨병은 어느 순간 씻은 듯이 낫는 질병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환자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이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10년 이상 얼굴을 맞대는 환자들도 여럿이에요. 환자라기보다 가족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다고 자신이 환자들에게 그리 상냥한 의사는 아니라는 말을 그는 덧붙인다. 하긴 당연한 일이다. 서로에게 항상 상냥하기만 한 가족이란 세상에 없는 것이다.
꿈이 있어 아름다운 오늘
‘뜻한 바 있어’ 의사가 됐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는 조금 싱거운 이유로 의사가 됐다. 의사가 꿈이었지만 색약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했던 그의 아버지가 자식 중에 한 사람은 의사가 돼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형 대신 그가 그 뜻을 이었을 뿐이다. 그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건 음대였다. 고교시절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음악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70년대 초반, 배고픈 ‘딴따라’의 길을 가려는 그를 가족들은 말리고 또 말렸다. 성적이 좋았던 그가 의대에 들어간 건 당연한 수순. 다른 꿈이 있었던 사람치고는 그럭저럭 적응해 나갔고, ‘큰 뜻과는 상관없이’ 어찌어찌 내과를 전공하게 됐다. 그런 그에게 ‘큰 뜻’이 생기는 사건이 생겼으니, 레지던트 3년차였던 83년의 일이다.
“은사님의 추천으로 일본에서 학회발표를 하게 됐어요. 당뇨병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앞서 있던지, 그 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래선 안 되겠구나, 일본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따라잡아야겠구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엇이 불끈 샘솟더군요.”
이후 그는 변했다. 당뇨병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가 돼야겠다고 마음먹고 공부를 계속해 나갔다. 넉넉지 않은 집안형편 때문에 그가 당연히 ‘개업’을 하리라고 믿었던 그의 어머니는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도 다시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에 당황했다. 하지만 끝내 유학을 택했고, 그는 점점 ‘돈’으로부터 멀어졌다. 하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부자였다. 꿈이 생겼던 것이다.
“돌아와서 6개월 동안 실업자로 지냈어요. 수입 한 푼 없으니 그것 참 황당하데요. 이후 얼마간 다른 병원에 근무하다가 89년에 아산병원 창립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연구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겠다는 꿈이 다시 솟아오르더군요.” 올해로 16년. 그 꿈은 아직 그의 가슴에 있다.
새로운 꿈도 생겼다. 꽃 피고 새 우는 시골에서, 흙을 밟으며 살아가는 꿈. 10년 가까이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는 2,3년 후쯤 경기도 양평에 아내와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릴 생각이다. 흙의 기운과 나무의 에너지를 가슴 깊이 빨아들여 그걸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나누어줄 작정이다.
논과 밭도 이미 구해뒀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주위사람들은 ‘풀이나 뽑을 줄 아느냐’고 놀려대지만, 그는 정작 그리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던 마음. 그 마음이면 농작물을 기르는 것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환자의 안색을 살피듯 농작물의 상태를 살피면, 한평생 ‘도시 촌놈’으로 살아온 자신을 농작물도 좀 예뻐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곳에 가면 그는 손놓은 지 오래 되는 클라리넷을 다시 불 수 있게 될까. 같은 상상을 하고 있었는지, 그의 얼굴빛이 까까머리 소년의 그것으로 돌아가 있다.
글·박미경(자유기고가) 사진·이영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