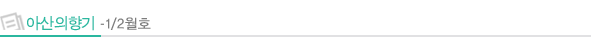|
 만남
만남 |
 조차장 - 3 조차장 - 3 |
이동석 |
|
|
1
1960년대에는 서해안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하와이에서 내려야 했다. 입국 세관이 하와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입국 심사대 앞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기다랗게 줄을 서 있었다. 그속에 한국에서 온 趙PD가 있었다. 심사관은 거드름을 피우며 이들을 심사했다. 이까짓 아시아인들…, 그런 심리였을 것이다. 趙PD의 차례가 왔다. 그는 심사관 앞에 여권을 내밀었다. 얼굴과 사진을 대조해 보면서 심사관은 이것저것 물었다.
“왜 왔냐? 어디에 머물 거냐? 얼마나 머물 거냐? 그런 질문이더라구. 당시는 아시아 모두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엘리트나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미국에 올 수 없는 형편이었지. 따라서 당시에 미국을 왕래하는 놈쯤 되면 그 정도 영어는 다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 나도 물론 그쯤은 대답할 수 있었지. 그렇지만 아까부터 속이 뒤집히는 거야. 제까짓게 뭐라고 사람을 눈아래 깔고 대하느냐 말야. 난 일부러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 귀에다 손을 올리고 크게 말하라는 몸짓을 하거나 말을 못한다는 시늉을 하면서 그놈 애를 먹였지. 약이 오르는지 그놈 얼굴이 서서히 달아오르더군. 곧 폭발할 눈치야. 나는 계속 약을 올리는 거지.”
2
趙PD는 Grammar English를 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직접 미국인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수준급 영어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시치미를 떼고 입국 관리와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그놈이 드디어 눈을 똑바로 뜨고 일어서더군. 나도 눈에 힘을 주었지. 그리고 품에서 로저스 국무장관의 초청장을 꺼내 그의 책상에 던지듯 내밀었어. 그런 다음 나는 드디어 정색을 하고 품위 있는 단어를 골라 영어로 말을 시작한 거야.
‘나는 너희 국무장관이 초청한 사람으로서 너희 나라의 귀중한 손님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다란 줄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 그것까진 참겠으나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도 너희들 편의대로 너희 나라 말로 나를 심사하고 있다. 보다시피 나는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러나 너의 무례함 때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국무장관에게 항의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당장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공손히 나에게 질문하기 바란다.’ 그랬더니만 그놈이 말야….”
1950~1960년대에 미국은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들이 미국을 눈에 넣을 수 있도록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로저스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미래의 미국 Supporters를 양성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趙PD가 선정되어 하와이에 도착한 것인데 오만한 입국 관리를 보고 입국장에서부터 자존심이 발동한 것이었다.
“갑자기 부동자세를 취하는 거야! 그리곤 격식에 맞춰서 딱 경례를 올리지 않겠어? 점잖게 받았지. 그랬더니, 한국어 할 줄 아는 분을 찾겠대. 그 동안만 기다려 달라는 거야. 그때부터 공항의 스피커는 한국어 할 줄 아는 분 계시면 와서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울려대는 거야. 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
이삼십 분 기다렸을까, 한국 사람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 심사관의 설명을 듣더군. 가만히 보니 내 고등학교 동창생이지 뭐야, 일찍 유학 온 동창생! 터지는 웃음을 겨우 참고 그 친구에게는 모른 척하라고 눈짓으로 입을 막은 뒤에 심사관에게 말했지. ‘매우 수고했다. 이제야 화가 좀 풀린다. 다음부터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기 바란다’고 타이르듯이 말한 거야. 그놈이 뭐라 한 줄 아나? ‘Yes sir!’였어. 공항을 빠져나와 동창생에게 그 설명을 하면서 둘이 배꼽을 잡았지.”
3
그 때 趙PD는 20대 후반의 젊은이였다. 그 젊은 기개(氣慨)는 OO대학 세미나장으로 이어진다.
“지구의 부존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뭐 그런 세미나였어. 각국에서 로저스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온 친구들이니 말발깨나 좋은 놈들 아니겠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데 미국 기자 한 놈이 자원의 부국, 빈국 따져가며 거만하게 구는 거야. 참다 참다가 한마디 했지.
‘맞다, 우리나라는 네가 말한 자원의 빈국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자. 우리 민족은 이삼천만 인구가 오천년의 세월 동안 한반도라는 좁은 땅을 파고 파고 또 파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너희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드넓은 땅을 인디언으로부터 빼앗아 이제 겨우 이백년 남짓 파냈을 뿐이다. 인구 밀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깨 부비며 살아왔지만 너희는 드문드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서 산다. 그렇다면 너희 땅에 부존자원이 더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결코 자랑이 아니다. 또한 강조돼야 할 점은 우리는 우리 땅만 파먹었을 뿐 결코 남의 땅을 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천년을 살면서도 지구의 부존자원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해악을 끼친 바가 결코 없다!’
그랬더니 유럽과 특히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기립박수에 가까운 환호성을 울리는 거야.”
4
趙, 趙차장! 그분은 어느날 불쑥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이었다.
“나는 말야, 이런 예감이 들어. 당신은 방송 생활을 한민족의 문제, 한민족의 냄새를 찾아다니는 일로 시종(始終)할 것 같은 예감….”
그것이 어떤 사주(使嗾)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 나는 전통 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제작해 온 것이다. 그분은 또 언제였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야,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어디 있든, 당신 서른살 생일날 저녁 일곱시에 당신 집으로 찾아 갈 거야. 만약 그때에 당신이 한복을 입고 앉아 먹을 갈아 붓으로 글을 쓰고 있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칼침을 놓을지 몰라!”
칼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주문이 너무나 멋있어서 나는 그날 그 시간에 먹을 갈면서 아내 모르게 대문을 여러 번이나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분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는 먼 곳에 가 있었다. 그 뒤로 나는 붓을 들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이런 말을 던지고 나서 영영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당신이 훗날, 바람쌩쌩한 겨울밤 아파트 문앞에서 군고구마를 구워 팔고 있더라도 그것이 당신 자신을 구현(具現)하는 도중이라 한다면 나는 달려가 당신을 부둥켜 안고 벅찬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거야!”
5
나는 지금 내 자신을 구현하면서 사는 것인지, 구현할 자신의 형상(形狀)을 그려 놓기나 했는지 그건 모른다. 그렇지만 그분이 남긴 말, 말, 말들을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 졸업하고 사회의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기에 그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 앞에 버티고 선 큰 나무였던 것 같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어느 외국으로 취재를 다녀온 후배로부터 “이러이러한 분이 묻기를 이 아무개가 아직도 방송일 하느냐고 합디다”라는 말을 들었다. 알 만한 곳이어서 몇번에 걸쳐 연락을 취했으나 그분은 응답이 없었다. 응답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 싶어 그냥 덮어둔 채 나는 이 알토란 같은 기억들만을 붙들고 오늘같이 그분을 그리워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약이 오르는 것은 그분은 나보다 여섯 살밖에 나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글쓴이 이동석은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전문프로덕션 리스프로의 대표이다. KBS 및 MBC 우수프로그램상 및 보도금상을 다수 수상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