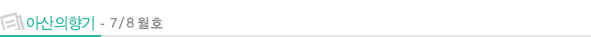|
 만남
만남 |
 상 파울루의 김씨 상 파울루의 김씨 |
이동석 |
|
|
노크 소리
14년 전 여름, 나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었다. 남미(南美) 한국인 이민자들의 현실을 취재하는 중이었다. 서울을 떠날 때 삐끗했던 허리가 상파울루에서는 아예 펼 수도 구부릴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그날도 나는 조연출과 카메라맨에게 취재 내용을 지시해서 현장에 내보내고 호텔방에 혼자 누워 아픈 허리를 원망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루하고 처량하고 화가 치밀기도 하는 심사를 겨우 달래고 있는 참인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똑똑…,
똑똑….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머리칼이 곤두섰다. 아는 이 없는 타국의 호텔방에서 혼자 듣는 노크 소리는 어떤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던 당시의 브라질에는 북한의 공작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똑똑…,
똑똑…,
똑똑….
노크는 계속되었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그였다. 나환자 같은 얼굴을 가진 김씨였다. 요 며칠 한인회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뒤편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감정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놀란대로 하자면 주먹이라도 한방 날려야 할 것이었다.
고수
“어제 회장님과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이 감독님은 허리 때문에 호텔에 남으실 거라고….”
“그래도 아무 연락도 없이…. 놀랐습니다 저는….”
“놀라시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 주제에 연락하고 다니겠습니까?”
전혀 미안한 얼굴이 아니었다. 되레 근엄한 표정으로 나에게 일어서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연히 왜냐고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뭉개진 얼굴과 선글라스가 빚어내는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그런 용기를 낼 수 없었다. 머리칼이 다시 곤두섰다. 나는 어정쩡하게 일어섰을 것이다. 그러자 그는 별안간 내 등뒤로 돌아와 내 머리를 두 손으로 싸잡더니 주저없이 비틀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허리 구부렸다 펴 보세요!”
짧은 순간, 창졸지간에 벌어진 그 상황을 미처 가늠하지도 못한 채 나는 겁먹은 아이처럼 되었고, 그가 시키는 대로 엉거주춤 허리를 움직였다.
“어때요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허리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 정말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그제서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허리도 나으셨으니 나가십시다. 브라질 커피 맛보셨습니까? 독합니다. 원액을 마시니까요.”
소주잔 크기의 커피잔을 사이로 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둘은 점점 기탄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돼갔다. 그는 합기도(合氣道)의 고수였다.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까?”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얼굴의 내력을 캐물으려 했다.
“특별히 안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말입니까? 하하. 딴 사람들은 묻지도 않아요. 뭐가 겁나는지.”
담배를 깊숙히 빨고 후련하게 토해내더니, 그는 월남의 정글 속으로 이야기를 끌고 들어갔다.
참전
그는 주월 한국군(駐越韓國軍)에 무술 교관으로 파병되었다. 무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만큼은 참전(參戰)이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을 만큼 재미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다. 베트콩의 대공격이 시작되었다. 자신에게 무술 훈련을 받은 아군 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아 처참하게 죽어나갔다. 눈이 뒤집혀진 아군은 사령부 요원까지 총동원하여 반격에 나섰다. 그때 김 사범도 투입되었다.
지축을 뒤흔드는 포탄과 포성, 눈을 부릅뜬 채 죽어가는 전우들, 피를 토하며 부르는 ‘어머니!’ 전장은 그대로가 참혹한 지옥이었다. 적어도 그의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그도 쓰러졌다.
……. 눈이 떠졌다.
의식이 희미하게 되살아 나면서 가느다란 신음 소리가 들렸다. 주위는 거의 모두 주검으로 덮여 있는데 그 틈에서 전우 하나가 가느다란 신음을 내고 있었다.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여 그를 옆구리에 끼고 겨우겨우 기어나오기를 십여 미터…. 포성이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포탄이 바로 전우 옆쪽을 때렸고 그 둘은 또 의식을 잃었다.
……. 다시 눈이 떠졌다.
전우는 죽었고 그의 얼굴은 나환자처럼 뭉개져 있었다. 그는 제대했고 십수 년 뒤 브라질 교포가 되었다.
지울 수 없는 기억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커피가 저 혼자서 식었다. 분위기가 풀리기를 기다려 나는 조심스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해 있던데….”
그는 허공을 바라본 채 담배를 길게 내뿜었다.영화의 한 장면같이….
“… 알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돈도 필요한 만큼은 벌었구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이 얼굴을 고친다면… 그날 밤 정글 속에서 죽어간 전우들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 배신 안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명인’이라 불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부님
그는 나를 태우고 교외로 달렸다. 차 속에서 그는 말했다. 그냥 보통사람으로 이민을 왔는데 하루는 원주민 청년들이 집으로 찾아와 사부가 돼 주기를 간청하더라는 것이다. 자신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 몇번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어느날, 날이 시퍼런 일본도(日本刀)를 들고 찾아와 “사부님의 징표로 우리가 직접 두들겨서 만든 이 칼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스승이 돼 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김 사범은 마침내 상파울루에 세 군데의 합기도장을 차리게 하고 그가 직접 지도에 나섰다.
그의 도장에 도착했다. 목조 2층 건물이었다. 사부님이 삐걱 소리를 내며 영화 ‘패튼대장군’처럼 계단을 오르자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차렷! 사부님께 경롓!”
그 순간 백여 명의 브라질 청년들이 마루에 부복했으며 사부님께서는 약간은 거만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시어 저 앞 사부님 의자로 가서 앉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왠지 자꾸만 신이 나는 것이었고, 내가 마치 사부인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장면을 즐기고 있었다.
그를 만난 것은 1989년 여름이었다.
글쓴이 이동석은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전문프로덕션 리스프로의 대표이다. KBS 및 MBC 우수프로그램상 및 보도금상을 다수 수상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