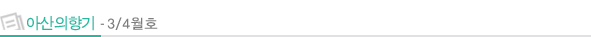|
 정훈소의 여백
정훈소의 여백 |
 메기와 종이비행기 메기와 종이비행기 |
정훈소 |
|
|
2중 3중의 방음벽이다. 외부의 공기방울 하나 스며들지 않는다. 소음과 모든 말들이 삭제된 세상. 나는 하루종일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는다. 어머니하고도, 동생하고도, 심지어 밖에서 전화가 걸려와 통화중인 애인하고도…. 그들은 나의 말을 못 알아듣고 나 역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기호가 달라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대신 나는 침묵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침묵을 맹인들의 점자처럼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읽어낸다. 그래도 나와 세상과의 의사소통에는 아무런 불편함이나 지장이 없다. 나에게 있어 침묵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이고 내 부레와 아가미를 숨쉬게 하는 공기주머니이다. 달리의 그림, 이곳에서는 시간마저 심하게 일그러져 있거나 벽난로 앞의 아이스크림처럼 책상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침묵의 바깥, 혹은 자꾸만 흘러내리는 시간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
안경알을 닦아내어도 뿌연 안개가 내린 바깥, 나의 안구가 감시용 카메라의 렌즈처럼 돌고, 풍경 하나하나를, 풍경과 풍경 사이, 알 수 없는 장면들을 초점이 맞지 않은 몇 컷의 뒤엉킨 필름으로 담아내고 있다.
여자는 화가 난 표정이다. 남자는 그곳이 금연구역이란 것도 잊은 듯 일회용 라이터를 탁, 탁, 신경질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재떨이를 찾고 있다. 종업원 계집애가 이맛살을 찌뿌린 채 차림표를 들고 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주문을 재촉하고 있다. 곧이어 주문한 술과 음식들이 쟁반에 받쳐 날라져 오고 남자가 컵에 술을 따라 연거푸 마시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되냐는 듯, 여자는 연거푸 술만 마시는 남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 내려다보는 여자의 표정이 잠시 미세하게 흔들리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 수 없다.
문이 소리없이 열리고 몇몇 사내들이 들어와 빈 테이블을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다. 그 중 한 사내가 턱짓으로 자리를 권하고 있다. 다시 종업원 계집애가 달려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은 계집애가 주방 쪽으로 사라지며 알 수 없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 오늘 따라 저녁손님이 많았었는지 사인을 보내며 사라지는 종업원 계집애의 종아리가 알밴 생선처럼 퉁퉁 부어있고 꽉 끼는 신발 속의 새끼발가락에 새롭게 물집이 잡혔는지 걸음걸이가 약간 절룩이고 있다.
2인용 테이블 앞, 노인이 하나, 좁은 홀 안의 창 쪽을 향해 아까부터 앉아 있다. 술은 거의 다 비워져 바닥을 보이고 있고 저녁 겸 안주로 시켜놓고 반도 비우지 못한 찌개는 식어 있다. 걱정이 되었는지 주인이 가끔씩 찾아와 식은 찌개를 다시 데워다 드릴까요 물어도 노인은 막무가내로 손을 내젓고 있다. 바닥을 보이는 술병과 비우지도 못하고 식어 버린 찌개, 그리고 노인 앞에 놓인 아무도 없는 빈 의자. 노인의 눈이 창 쪽의 하늘을 향해 허공처럼 열려져 있다.
다시 달리의 그림 속, 시간은 굴절현상으로 심하게 구겨져 서행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나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다. 숫컷 한 마리가 코를 벌름거리며 나를 냄새 맡고 있다. 좀더 자세히 보니 자신의 미끄러운 몸을 나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적거리고 있질 않은가! “나는 아니야, 저리 가, 이 더러운 호모새끼야!” 나는 얼른 소름 돋은 몸을 피해 몸들과 몸들을 헤집어 달아난다. 사실 나도 이곳에 오고부터 얼마를 굶었는지 모른다. 몇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다. 도통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요즘 생리중이거나 임신중일 거다. 그녀의 깊고 어두운 골반 안에는 남의 씨가 알로 잔뜩 슬어 있을 거다. 야음을 틈타 뒷골목 어딘가에 곧 산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 폭의 추상화처럼 뒤틀리고 누글누글한 이 가상의 시간 속에서 어미와 아비의 생을 부여받아, 다시 수풀 속 수면 위로 떠오를 알 속의 치어들…. 생이란 단 한번으로도 족한 것인데 왜 이렇게 끈끈하게 달라붙는 것일까? 이 지겨운 반복을, 그냥 단 한번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글쓴이 정훈소는 시인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