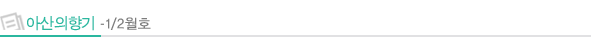|
 향기로운 세상
향기로운 세상 |
 야학교사로 산다는 것은 심지야간학교 야학교사로 산다는 것은 심지야간학교 |
조은수 |
|
|
그 이상의 그 무엇
분명히 수업 시작 2시간 전인데 심지야간학교의 작은 공간에서는 꺼질 줄 모르게 이야기 소리가 타오르고 있었다. 교사교육 중이란다.
대학생 신분으로 가르치기 위해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선생님으로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한 점으로 쓰여지기 위해 심지야간학교의 젊은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다. 열정이라는 배움의 심지가 선배 교사들의 경험이라는 공기를 만나서 그 둘이 소통함으로써 배움의 빛을 내고 있는 것이겠지…. 이 소통은 수년간 그리고 어제의 교실 현장의 하루가 축적되어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곳에서는 대학생들이 곧 선생님이고 자원봉사자이고 실무자이며 또한 연구자이다. 또한 천차만별의 학생들에게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일 이정표를 꽂아가야 하고 지나온 길을 밝혀 놓아야 한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야학에는 힘든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2년 동안 섬겨온 한 교사의 확신이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마음에 뜻을 세워
‘마음에 뜻을 세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심지(心志)야간학교에서는 27명의 교사들과 50명의 학생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한글반에서부터 초등반, 중고등반까지 각 반은 5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임도 있고 반장도 있고 학급회의도 한다. 모양새로만 보아도 여느 학교에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뒤지지 않는 향학열이 살아 있다. 연령층도 넓고 각각의 사연도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배움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배움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조심스레 그 불씨만 가지고 여태껏 살아온 시절들이 있기에 서로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교사와 학생의 신분, 학력, 성, 직업, 나이 등에 따른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과 인간으로서 소통하며 어우러져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가족이다.
“자취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자연스레 정도 많이 들어요”라고 말하는 김효원 선생님의 시선이 교무실 한 모서리에 있는 참기름 병이며, 소박한 반찬통에 박힌다.
섬기는 사람들
선생님과 학생은 각각의 역할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배우는 거죠.” 김효원 교장 선생님의 수줍은 고백이다. 주는 이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는 것. 당신은 필요한 존재라고 눈빛으로 말해 주는 것. 섬김의 부산물이라고 했던가? 바로 이것이 ‘맹신’이다 싶을 정도로 야학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녁시간에 학과 공부 못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곳에 있는 게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맹신’이라는 표현에서 나는 그것이 섬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발견’임을 보았다.
말 없는 노래
말 없는 노래. 마음으로 전달 되는 그것은 바로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랑이었다. 내게 너무 당연한 초등학교 졸업장. 하지만 할머니 학생의 초등 검정고시 합격 전화를 받고 같이 울며 껴안고 춤출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랑은 말이 없는 노래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삶의 노래이다.
글쓴이 조은수는 아산장학생이며, 본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