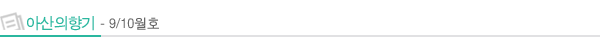|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죽음을 곁에서 보며 살아가는 그녀, 노란순 씨. 그녀의 일터는 장례식장이다. 장례식장 하면 괜히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녀는 이곳이 좋다.
남편을 보내고
올해로 53세가 된 노란순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제약회사
공장에도 다녔고, 파출부, 비누장사, 조리사 등 안해 본 일이 없다. 그러다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신축할 때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남편의 투병 생활과 사별로 3년 정도 이곳을 떠난 기간을 빼고는 8~9년 동안 줄곧 이곳에서 일해 왔다.
남편은 성실했고 일도 잘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그녀도 풍족하진 않았지만 바르게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았다. 어느날 남편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의사는 폐암이라고 했다. 남편은 건강 체질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정신이 아득했다. 의사는 '이렇게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 고통이 무척 심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왔냐'며 오히려 나무랐다.
"이상하게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보다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또 남편에게도 좋은 생각만 하라고 곁에서
늘 얘기해 줬지요."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녀는 힘드니까 이젠 편히 가라고 애기해 줬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과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폐암으로 진단받은 지 꼭 3개월만에 남편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
천주교 신자인 그녀는 병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아 왔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보냈는지도 모른다. 편안히 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내일 죽는다면'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도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죠.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 달리 쓸 말이 없더라구요.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후회가 되고,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썼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삶의 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란순 씨가 늘 생각하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불려가더라도 갈 수 있게끔 항상
준비된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도 자주 한다. 그녀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친구,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와 주는 친구, 아프면 찾아오고, 외로워하면 노래방이나 극장에 데려가는
친구들이 그녀의 곁에 있다. 매번 신세만 져서 미안하다는 그녀는 '내 모든 은인들에게 축복을 달라'고 매일 기도 드린다.
노란순 씨는 마음이 맞는 성당 사람들과 함께 10여 년이 넘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목욕, 빨래, 청소 등의 봉사를 해왔다.
이러한 노력 봉사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다달이 조금씩 돈을 보내고, 탄광촌 어린이들에게도 명절이나 어린이날에는 선물을 보냈다.
여러 활동 중에서도 그녀는 유독 아픈 사람들에게 눈길이 더 간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듯이
환자 가족들과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아산재단 사회복지팀에 적은 액수나마 기부하고 있다.
"월급을 받으면 매번 고민하죠. 이 달에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하면서 망설이다가 결국엔 또 내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새 희망을 주는 사람
진정한 나눔이란 결코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늘 모자람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노란순
씨는 진정 큰 사람이다.
여러 사람이 동참하면 더 좋겠지만 강요할 수도 없는 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씩만 돕는다면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20년 전에 안구 기증을 신청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시신도 기증하고 싶다고
말한다. 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노란순 씨의 꿈은 호스피스.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고 싶어하는 그녀는 아침 햇살 같이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글쓴이 방은경은 아산재단 편집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