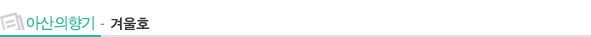|
 문화가 산책
문화가 산책 |
 “건축은 세상을 천천히 바꾸죠” “건축은 세상을 천천히 바꾸죠” |
정재숙 |
|
|
집이 많아도 괴롭고 없어도 괴로운 시절이다. 집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최근 논쟁은 집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을 집약한 한 상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집이 애물이자 괴물이 된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더 제대로 된 집 얘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이가 건축가 정기용 씨다. 그의 건축세계로 들어가 본다.
건축가 정기용 씨(61·기용건축 대표) 하면 그가 우스갯소리처럼 털어놓던 ‘고난의 인생 역정’이 떠오른다. 1945년 광복 두어 주 전에 태어난 그는 “내가 자네들과 달리 일제 강점기를 보름 너머 거쳤기에 웬만한 어려운 일은 너끈히 넘기지” 한다. 그와 건축기행을 떠나보면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강철 인간’ 정기용을 만날 수 있다. 하루를 48시간으로 늘려 사는 그를 좇아가려면 신발끈을 다시 매야 한다. 그가 설계한 서울 강남 ‘코리아나 박물관’에 올라서도 그랬다. 그는 “건축에서 빛과 그림자는 진실·평온·힘을 지닌 건축의 확성기”라고 말했다. 코리아나박물관 옥상 정원에 오르니 빛과 바람과 물이 하나로 다가왔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온갖 잡생각이 들었다. 집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로운 시절이다. 집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최근 논쟁은 집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을 집약한 한 상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집이 애물이자 괴물이 된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더 제대로 된 집 얘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이가 정기용 씨다.
“예전에는 스스로 살기 위해 건축을 했잖아요. 이제는 팔기 위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물을 생산하는 시절이죠. 건축과 건설을 혼동하고 있는 이 땅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어 버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건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탄식하듯 질문을 던진 건축가는 말한다. “상품 고르듯 모델하우스 앞에서 자기 집을 꿈꾸며 돈 계산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집은 더 이상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복권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이름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낱 평수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환자가 되보고 나서 설계한 병원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유리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건축가는 제주도에 설 병원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병원을 지으려면 병원을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건강검진까지 받게 된 1년 전, 그는 스스로 ‘깊은 감기’라 이름 붙인 암을 찾아냈다. ‘인생역정’ 제 2막이라고나 할까.
“병을 앓고 치료하면서 몸을 재발견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병원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크게 깨달았죠. 철저하게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병원 공간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동안 아프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본 병원을 떠올려보니 그게 형무소 풍경이더라고요.”
그가 설계한 새 병원은 환자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환자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즐겁게 치유의 과정을 지낼 수 있도록 구석구석 눈길을 보냈다. 건물 옥상에 걷는 길을 다양하게 만든 것이 한 예다.
“후줄근한 환자복에 링거 대를 밀며 꾸부정한 자세로 복도나 좁은 마당을 오가는 환자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측은해요. 내가 병을 앓고 보니 사람이 살아있음을 확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걷는 것이었어요. 나는 걷는다, 고로 존재한다, 랄까. 치료 과정으로도 걷기는 중요하죠. 환자가 품위 있게 맑은 공기와 자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걷는 길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다 기적이다”
‘건축가 정기용’을 세상에 널리 알린 프로젝트는 ‘기적의 도서관’이다. 2003년 순천을 시작으로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은 그의 표현 그대로 ‘다 기적인’ 사업이었다. 시민운동이 일군 기적이요, 사회가 건축을 생산한 기적이다.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과 건축가 정기용이 손잡고 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 탄생시킨 희망의 집이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국경 없는 자유로운 세계인이라는 생각에서 계획됐어요. ‘기적의 도서관’은 작은 우주가 되어 어린이들이 책을 매개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장소죠. 그래서 쇠와 나무와 물과 빛과 흙이 어우러져 건축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도록 꾸몄어요. 먼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모습의 별나라 열람실도 있고 실외에는 천천히 걷는 미로도 있죠. 책과 어린이가 만나는 여러 길, ‘발견’의 연속인 미로의 끝에서 ‘시간의 샘’을 만나는 셈입니다.”
그가 요즘 설계하고 있는 김제 지평선중학교의 기숙사나 고창 노인복지관도 일종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이 쥐꼬리만한 상태에서 시작한 집짓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흙으로 도자기 실습실을 만들고, 다음에는 목공실을 짓고, 이어 기숙사를 잇는 식으로 실비 차원에서 진행해왔다.
“예산에 맞출 줄 알아야 좋은 집, 좋은 건축가라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는 대충 세 가지 종류의 건축가가 있어요. 이건 내 작품이요, 생명이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창작품이다 하는 예술적 건축가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적어도 세상과 사회가 뭘 원하는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인간사 소통에 이바지하는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건축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집짓기의 기계공학적 과정과 논리에 충실하겠다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두 번째 건축가를 꿈꾸지요.”
건축은 인문학, 인간학
그는 “건축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천천히 바꾸는 데는 한 몫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건축을 인문사회학 또는 인간학으로 분류하는 까닭이다. 사람과 인생이 전제되지 않은 건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가 강조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건축 기술 이전에 동시대의 수많은 사람과 사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식의 폭을 넓히라고 가르칩니다. 시대정신을 넘나들 수 있는 지식과 소통의 횡단이지요. 그 사회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열린 마음이 건축가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기용식 스타일은 없다”고 했다. “건축은 (눈에 보이는 외양의) 형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른 건물과 차별화되거나, 세련되고 근사한 마무리로 번쩍거리는 브랜드가 자신이 지향하는 건축이 아니라는 얘기다. 건축에 무엇을 실어 보낼까 하는 메시지가 그에게는 중요하다.
“건축이 전달하는 흔들림 없는 힘, 우리를 에워싸는 순간의 빛, 그리고 파동 치는 존재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좋은 건축이 선사하는 건축의 위대함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