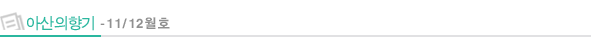|
 테마 2
테마 2 |
 테마 2 - 미술관 순회버스 테마 2 - 미술관 순회버스 |
염복남 |
|
|
 |
안국동 사거리에서 미술관 순회버스를 타다
미술관 순회 버스가 있다 하여 찾아가 보았다. 안국동 사거리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금호미술관, 갤러리 현대를 비롯하여 평창동의 가나아트 센터를 경유하며 순회한다. 각 정류장에는 주요 미술관 이외에 다수의 미술관이 산재해 있어 다양한 전시전을 볼 수 있다.
버스 안에서
버스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은 역시 운전기사다. “어서오세요!” 인사를 하며, 승객들의 얼굴들을 일일이 보며 미소로 맞아준다. 화가들이 쓰는 꼭지 달린 모자를 쓴 것이 인상적이다. 각 미술관을 지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것이 웬만한 전문 평론가를 무색케 한다.
운전기사는 5년 전 미술관 순회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한 이래로 줄곧 같이 하였다고 한다.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운전기사는 어느새 손아랫사람인 기자에게 말을 놓는다. 아버지같이 편안하여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번의 접촉 사고도 허용치 않았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미술관을 관람한 후 돌아올 때마다 번번이 승차 시각에 지각하는 것을 불평 한 마디 없이 태워준다.
금호 미술관
가장 먼저 내린 곳은 금호미술관이다. 미술관 주변엔 순수미술 작품 전시전뿐만 아니라, 한복과 보석 장신구 등과 같은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갤러리들도 있다. 미술관 건물내에 들어선다. 전시장 특유의 침착하고 아늑한 공기가 흐른다. 그 속에 몸을 담고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신다. 바깥에서 가져온 공기를 모두 내쉬어 차츰 작품들을 관람할 준비를 한다.
작가 한석란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중이다. 작품들 속에서 무엇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했지만 역시 문외한에겐 힘들다. 평소 전시회를 보는 훈련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운이 좋아 작가 한석란을 만났다. 한석란 씨는 자신이 보여주는 만큼 사람들이 얻어갈 순 없다고 말한다. “그리는 사람도 역량만큼 그리지만, 보는 사람도 역량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알아보려고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작가가 무엇을 그리려 한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알 수 있지요. 작가는 빛, 색, 풍경 등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정신세계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뜻하지 않게 ‘가르침’을 받아 조금이나마 미술을 보는 눈이 생긴 듯하여 우쭐해진다.
갤러리 현대
다음으로 간 곳은 갤러리 현대이다. 전시장 내에 많은 작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개의 작품들이 있다. 그러나 결코 전시장이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작은 작품들이지만, 공간을 가득히 채우는 무엇인가가 있음이 느껴진다.
일명 ‘대지의 작가’ 박영남의 작품들이다. 작품의 제목들도, ‘하늘에 그려본 풍경’, ‘눈이 오길 기다리며’, ‘하늘에 뿌린 삼각형’이다. 특이한 것은 붓을 사용치 않고 손가락으로 작업한 흔적들이다. 전시장 귀퉁이에 작가의 한 마디가 적혀 있다. ‘캔버스가 대지이길 바라며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 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길 바란다.’
가나아트 센터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가나아트센터이다. 도심에 있지 않고 주택가에 위치해서인지 여느 미술관들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게 보인다. 건물 안은 전시장, 생활공간 제시전, 레스토랑,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주로 추상화가 전시된다. 지금은 작가 하동철의 ‘빛·공간·구조’라는 전시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장 안은 말 그대로 ‘빛의 정원’이다. 작품들을 마주할 때면 어떤 이미지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쏟아지는 폭포수, 새벽, 장대비 내리는 바다 등 자연 이미지들이다. 단순한 선의 나열, 색 등이 빛을 표현하고, 빛은 자연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한다. ‘플라톤의 마당에 서서 데카르트와 칸트를 인식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작가의 노트가 작품 설명을 한 마디로 해준다.
다시 버스 안에서
회귀하는 버스를 탔다. 의자 깊숙이 무거운 몸을 싣는다. 많은 시간을 걸어 피로한 감이 든다. 그러나 정신적인 여유가 있다. 미술 작가들에게는 세속과 또 다른 종류의 풍성함이 있다. 작품 속에서 이 풍성함을 한 아름 들고 나왔다.
글쓴이 염복남은 아산장학생으로, 현재 본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