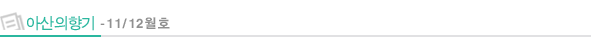|
 테마 2
테마 2 |
 테마 2 - 홍익대 앞 거리 테마 2 - 홍익대 앞 거리 |
조은수 |
|
|
 |
홍대앞 거리에 가면 오감을 다 활짝 열어라 !
홍대앞은 ‘튐’이라는 문화적 코드로, 우리에게 젊음과 살아있음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그곳에서는 단정한 머리와 고급스러운 정장으로 감상하는 품위있는 문화가 아니라, 조금은 꼬질해 보여도 그것이 나만의 것이라면 용서가 되는 폼나는 문화를 만날 수 있다.
홍대 앞에는 몬가 특별한 것이 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 2년차, 홍대 앞은 뭔가 특별하다고 들은 풍월도 몇 년. 홍대 앞에 가면 턱수염 지저분하게 기른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고뇌의 주름을 새기고 있고, 감히 소화해 내기 힘든 차림의 젊은이들이 거리를 누비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아니 왠걸? 홍대입구 역에서 내린 나의 눈에는 서울의 시내가 펼쳐져 있었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대리석의 은행 건물들….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겨우 실망하는 마음을 꼭꼭 담고 뭔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을 때 다른 대학 앞 놀이 공간들과는 다르게, 일반 대학가에서 실컷 놀고 났을 때 얻어 가는 왠지 모를 허무함을 채워 주는 공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채움의 공간들을 찾아내는 데는 일상 속에서 삶의 진리와 의미를 포착해 내는 예리한 예술가의 눈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무심코 넘기지 않는 예술가의 마음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길거리에서
어울마당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바람. 그리고 누구의 손길인지 모르는 특별한 가로등. 가로등 기둥을 따라 시선이 미끄러졌다. 길 자체가 작품의 둥지이고, 벽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이거구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뽐내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남기는 것. 그것만으로 의미있는 것.
공간 안에서
홍대를 앞에 두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가구 전문점들이 많다. 그럴싸한 세팅으로 치장한 공간이 아니라 땀이 있고, 못과 망치가 있고, 톱이 있고, 색이 있는 곳들이다. ‘색깔있는 나무’라는 한 가구점의 상호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곳의 나무에는 색이 있었다.
구석진 곳으로 더 들어가면 똑같은 레디-메이드가 아닌 수제품을 파는 곳을 만날 수 있다. 똑같은 그릇이라면 진열장에 쌓인 광택 없는 흰색의 미완성 그릇들일 뿐이다. 자신이 입을 옷을 기다리고 있는 그릇들은 설레 보였다. 직접 인형을 만들어 파는 가게도 있었다. 국악소리 은은한 가게 안에서 주인 아가씨는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꾸밈없는 차림으로 인형들을 꾸미고 있었다. 홍익대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그림이 좋아 그렇게 아직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성공이라는 누군가가 짜놓은 설계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려내는 것…. 소비와 창조가 동시에 있는 이곳 작은 공방들은 그렇게 홍대 앞 독특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귀의 문화, 목청의 문화, 눈의 문화, 오감을 다 사용하자!
어둑어둑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더욱 바빠졌다. 7시경에 시작되는 클럽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홍대 앞 땅 밑에서 마그마가 요동하기 시작했다. 강한 비트와 거침없이 내뱉는 목소리, 솔직한 가사…. 심장이 뛴다, 몸을 들썩인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면 그곳은 또 다른 세계이다. 한국 음악계의 비주류들이 주류가 되는 이곳에서 수많은 애악(愛樂)가들은 관객과 하나가 되어 호흡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음악을 창조하고 재창조한다.
유명한 클럽으로는 ‘드럭’ ‘재머스’ ‘프리버드’ ‘롤링스톤’ ‘쌈지스페이스 : 바람’이 있다. 하지만, 유명하다고 눈에 잘 띄는 것은 아니다. 잘 갖추어지고 홍보된 놀이터가 아니라, 찾는 이들에게 보이는 놀이터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문화 / 예술의 헌혈차
분명, 홍대 앞의 문화는 독특하다. 동시에 대표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홍대 문화가 아시아를 대표한다고까지 하니…. 한국 곳곳의 젊은 피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되고, 또 다시 밖으로 나아간다. 홍대 앞의 문화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주인공 되어 만들어 갈 뿐 아니라, 이 문화 또한 여러 창조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피를 제공해 준다. 어디 한번, 노래방에서 번호를 누르는 대신에 키보드를 누르고 ‘나’를 질러 볼까?
글쓴이 조은수는 아산장학생으로, 현재 본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