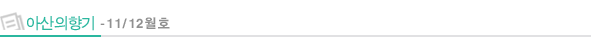|
 테마 2
테마 2 |
 테마 2 - 서울시립미술관 테마 2 - 서울시립미술관 |
남영숙 |
|
|
 |
덕수궁 돌담길 따라 미술관에 놀러가자 - 유준상 초대 서울시립미술관장과의 차 한잔
시청 앞…. 매일 헐고 부순다. 변화를 먹고 사는 살인적인 인구밀도의 도시, 서울의
심장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시청역에 내렸다. 12번 출구로 나온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은행잎 카펫을 밟는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노란 벽돌길 같다. 이번엔 색색깔 고운 단풍들의 호위를 받는다.
그리고 길 끝, 탁 트인 마당에 옛 건물 한 채가 있다. 당신은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 도착했다.
말만 무성한 ‘모래 위에 집짓기’
문화? 문화를 얘기할 때면 으레 주눅부터 드는 기분이다. 게다가 미술? 미술은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무슨 성스러운 모의를 하듯 미술관은 마치 ‘그들만의 리그’ 같았다. 그런데 미술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 이가 있다. 초대 민선 시립미술관장인 유준상 선생님을 만났다.
“미술관은 보여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언설(言說)’, 입하고 귀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말로만 미술을 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예술문화 전통이란 모두 서민들의 눈과 손으로 이뤄낸 것 아닙니까?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조목기, 민화 등이 모두 그랬지요. 우리나라엔 소위 귀족 예술이 없어요. 조선시대를 예로 들자면 세습적인 계급으로서의 양반들이 편협한 특권의식으로 정치나 했죠.”
순간 의구심이 들었다. 우리의 문화가 땅 속에 묻혀 모르는 건 아닌지, 잊혀진 건 아닌지 물었다.
“어디서 뭘 발굴을 합니까? 그건 우리의 기대죠. 기대와 현실을 착각하면 안되죠. 가까운 조선시대만 해도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느라 경주 남산, 그 산골짜기마다 모셔둔 부처님들까지 모두 헐어 냈어요.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대상은 다 제거하는 ‘우상 파괴’ 아닙니까? 눈 감고 손 쓸 줄 모르는 유교적인 관념 탓이죠. 맨날 ‘생각만’ 하는 그 잔재가 아직도 있으니 문제입니다.”
시민들과의 간격 메우기
서울시립미술관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있다. 1920년대 경성재판소로 건립, 해
방 후에 대법원으로 쓰인 건물의 외벽을 그대로 살리고 뒤에 전시장을 붙였다. “나이 든 이들은 대법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뒤에 가봐야 전시관이 있는 거지.” 정동극장, 정동교회, 옛 러시아공사관, 정동이벤트홀, 스타식스 영화관 등 서울의 근현대 문화 유적과 현대 시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 정동길에 터를 잡은 이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시립미술관엔 벽도 없다.
“담을 헐어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했지요.” 대신 벤치들이 자리한 너른 마당엔 점심시간이면 주변 직장인들이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을 들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됐다. ‘시립’이란 이름의 자랑스러운 변신이다.
문화는 사회적인 습관
현재 일본 전역에 걸쳐 순회전시 중인 서울시립미술관의 개관 작품 ‘한민족의 빛과 색’.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의 초석을 세운 한국 미술계의 사건이었다. “개관전은 한민족이 어떻게 빛과 색을 수용했는지를 쭉 보여준 전시입니다.
하늘에서 빛을 쏘면 이를 반사하여 색이 태어나고…, 빛과 색은 눈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옛날 반짇고리나 매듭, 자수 등 우리 삶에 밀착된 작품들을 통해 우리의 빛과 색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빛과 색이 뭐냐? 제일 쉽지 않습니까? 현대미술이 어떻다느니 전문적인 말을 어렵게 하기 시작하면 안됩니다.”
문화는 ‘습관’이라고 유준상 선생은 말한다. “서울 시민을 위한 미술관이지, 미술가만을 위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자꾸만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좋은 습관이 몸에 젖어야 ‘문화인’ 아닙니까? 저는 문화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습관, 좋은 습관, 본받고 싶은 습관이 문화입니다.
단적으로 외국사람들이 왔는데 한국을 소개한답시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며 떠든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 지겹다구요. 그건 언설이지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는 ‘눈에 보이는 습관’이에요. 고금동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눈 있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문화인데, 눈 감고 귀만 열어 놔라 해놓고 떠들어봐요. 도망갑니다.”
손 잡고 벽 짚고 전시장 높은 계단을 줄맞춰 오르는 아이들을 보았다. 선생님이 아무리 ‘입에 풀칠하기’ 주의를 줘도 어른 허리도 안 되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은 두리번두리번 재잘재잘 신나하였다. 루소가 ‘하얀 백지’라고 불렀던 이름의 아이들이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풍경이다. 그렇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글쓴이 남영숙은 아산장학생 동문으로, 현재 본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