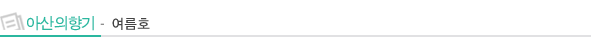|
 테마
테마 |
 버려진 물건들은 꿈을 꾼다 버려진 물건들은 꿈을 꾼다 |
조병준 |
|
|
2차 술자리에서 이미 나는 꽤나 취해 있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 남은 사람들은 물론 ‘한 잔만 더!’를 외쳤다. 나는 머리를 굴렸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집이 하나 있어. 가자.” 내게 가장 좋은 집은 물론 내 집이다. 젊은 후배들을 끌고 골목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어느 레스토랑 앞에 한 무더기 잘린 나뭇가지들이 있었다. 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나뭇가지를 집어 들었다. 후배가 말했다. “형, 그걸 뭐 하러 가져가요. 쓰레기잖아.”
후배에게 쓰레기였던 그 잘린 나뭇가지 두 개는 지금 내 방에 누워 있다. 그날 밤 어깨에 그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올 때는 분명 내 머리 속에 어떤 그림이 있었다. 문제는 그 날 밤 우리가 보드카 반병을 비웠고, 그래서 그 그림이 하얗게 지워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 이후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방바닥의 저 나무는 뭐예요? 설치작품인가요?” 물론 그런 질문이 비아냥이라는 건 나도 잘 안다. 그렇잖아도 어수선한 내 방에 드러누운 나무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크 아트(Junk Art)’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던가. 쓰레기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예술가들의 매의 눈 같은 눈길과 매발톱 같은 손이 쓰레기를 움켜쥐게 된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정크 아트라고 이름 붙여진 예술 작품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거기엔 비판은 넘쳐나고 있었지만, 애정은 별로 보이지 않았으니까. 내 취향일 뿐이라고 하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만, 예술작품은 비판을 넘어 대상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술작품이라고 불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젊은 예술가들은 정크 아트의 한계를 폴짝 뛰어넘어 앙증맞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모양이다. 고발과 비판을 뛰어넘어, 버려진 물건들을 ‘쓰레기’의 운명에서 건져내어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예술.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재활용 예술’이라는 말을 붙여준 모양이다. 재활용. Recycle. 다시 순환시키기.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생명은 순환이다. 생명을 만드는 힘은 언제나 사랑인 법이다. 재활용 예술에는 드디어 애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다시 살려내기, 다시 굴러가게 만들기.
박하니의 작품들을 처음 본 건 홍대 입구의 정말 작고 허름한 카페에서였다.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였던 그 작은 공간에서 박하니와 그의 친구들이 재미난 전시회를 열고 있었다. 그 옹색한 전시장에는, 그러나 결코 옹색하지 않은 상상력과 섬세하고 품 많이 드는 노동력이 결합하여 빚어낸 ‘새로운 생명’들이 숨쉬고 있었다. 쓰레기 매립장 또는 소각장, 아니면 재생 공장으로 갔어야 할 피자 박스, 다기 포장용 나무상자, 낡은 LP, 나사못, 빨대, 빈 화장품병…. 그런 것들이 용케도 ‘사라질 운명’을 거역하고 다시 태어나 있었다. <꽃무덤>이라는 제목의 작품에는 그녀가 쓴 시가 꽃처럼 피어 있었다. 그 전문을 여기에 재활용해 본다.
꽃무덤
당신이 슬픔의 바다에 빠져 발버둥칠 때 / 그 물결따라 씨앗하나 밀려와 / 내 너른 가슴에 꽃 한송이 피웁니다
당신이 기쁨의 햇빛을 받아 미소지을 때 / 그 햇살따라 씨앗하나 내려와 / 내 너른 가슴에 꽃 한송이 피웁니다
당신의 작은 손짓 한 웅큼에도 / 당신의 작은 눈짓 한 조각에도 / 내 끝없는 가슴에 꽃 한송이 피웁니다
당신 아나요 / 그 아름다운 꽃밭 / 그 향기로운 꽃밭 / 그 아래 묻혀있는 나의 뼈조각들을….
뼈와 꽃. 이런! 이 젊은 작가는 어찌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인생의 숨겨진 진실을 눈치채 버린 것일까. 죽음을 영양분으로 하여 생명이 꽃핀다는 것을 어찌 그리 선명하게 알아버린 것일까. 용도를 다하여 버려진 물건들은 이를테면 뼈 같은 존재일 터이고, 어떤 뼈들이 꽃을 피워내듯이 어떤 폐품들은 꽃 같은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녀는 말했다. 좀더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어디를 가든 길거리에서 주워들고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버려진 물건’들이 있다고. 방이 좁아 그 물건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돌아설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가만, 그녀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던가? 그냥 아쉽다고 했던가? 무슨 상관이랴. 버려진 물건들 속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들, 다시 태어나 꽃피는 순간을 향한 순환의 꿈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다는 뜻의 말이었을 터인데.
글·조병준 (시인, 문화평론가) 사진·본(Bon) 스튜디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