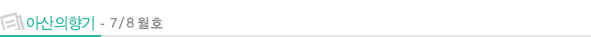|
 테마
테마 |
 몸, 춤, 삶: 다르게, 또 같이 몸, 춤, 삶: 다르게, 또 같이 |
조은수 |
|
|
만남의 장소는 사방이 거울로 둘러 쌓인 무용실이었다. 몸의 섬세한 근육의 움직임까지 잡아내고, 몸을 사랑해야 하고, 몸을 통한 춤으로 사랑해야 하는 무용가. 가리고 싶어도, 숨기고 싶어도 정직해야 하는 것이 부부이기에 무용실에서의 그들의 몸, 춤, 삶의 이야기가 더욱 솔직하게 다가왔다.
몸
큼지막한 이목구비, 각진 얼굴선, 큰 키, 긴 팔, 굵은 뼈의 한 여성.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둥근 얼굴선, 약간 통통한 몸매,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한 남성. 그들은 바로 부부무용가 송정은 씨와 조남규 씨이다.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송정은 씨와 세세한 에피소드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조로 이야기하는 조남규 씨. 얼핏 생각하기 쉬운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그들은 외모, 말투… 모든 면에서 너무 달라보였다.
춤
몸, 그 자체만으로 노래하고 그려야 하는 무용가들이기에 몸에서 드러나는 둘의 다름은 춤을 통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가 배우고, 익혀온 저만의 춤의 이미지가 제 몸의 구조와도 맞았고, 그것을 몸짓으로 표현을 할 때에 객석에서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송정은 씨의 자신의 몸과 춤에 대한 고백이었다. 직선적이고 역동적인 춤을 추는 송정은 씨는 그녀 특유의 긴 팔을 자랑으로 여긴다. 팔의 길이도 길기 때문이지만, 각이 큰 동작을 구사하고, 동선도 크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큰 무대를 장악할 수 있고,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인 ‘청동그림자’는 과거 우리나라 기녀들의 품위와 위엄이 춤으로 안무된 창작 무용이다. 우리나라 여인네들 특유의 무감동의 절제미가 웅장하고 강렬하게 표현된 ‘청동그림자’는 죽 뻗은 팔을 사용한 직선적인 동작을 통해 올곧음과 절제가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그에 반해, 조남규 씨에게는 ‘한량무’가 대표작이다. 한량무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선비들의 춤이라고 덧붙여 그가 자신의 춤을 설명하였다. 한량무는 옛 한량의 걸음새를 연상시키는 발디딤새와 양반의 자태를 그려내기 위해 한 손에 부채를 들고 긴 소매깃을 흥겹게 앞뒤 좌우로 휘저어대는 춤사위에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한국적인 전통 춤사위의 측면을 두루 갖춘 조남규 씨의 둥근 몸 라인과 고운 외모와 섬세한 성격과도 아주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조남규 씨는 잔가락이 많고, 정적이면서도,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어우러지는 듯한 곡선적인 춤을 춘다.
이들의 독특한 몸의 움직임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였다. 수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과감함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나가는 꾸준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이 있을 수 있었다.
삶
같은 길을 가는 그들이 살아온 다른 삶의 이야기는 마치 직선과 곡선과 같았다.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지만 결국 직선과 곡선은 하나다. 곡선을 세밀히 보았을 때에 수많은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직선과 곡선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다.
영·호남의 가정적 배경도 무시하지 못했겠지만, 걸어온 무용의 길도 달랐다. 다른 스승 밑에서 그들은 다른 춤을 입었다.
“에고, 처음엔 말도 못했죠.”
수줍은 듯 웃는 조남규 씨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 여운이 담긴 그의 숨소리에 그들의 인생 얘기가 문득 궁금해진다.
처음에는 싸우기도 많이 했단다. 작품을 할 때에도 많이 부딛혔다. 각자의 독특한 춤의 세계를 가지고 공동작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창조적 개성, 이것으로 살아가는 ‘예술인’이 아닌가.
이런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별개의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었다. 흔히들 선택하는, ‘존중이라는 가면을 쓴 무관심’의 길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다. 두 갈래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길을 만들었다.
이러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길 위에 길’이라는 작품으로 선보인 바 있다. 두 사람의 성장과 만남, 현재까지의 모습이 춤으로 형상화되기도 했을 만큼 두 사람이 걸어온 길 위에 또 다른 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다르게, 또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부부 무용단으로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신뢰 때문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로지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한 비판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한 작품에 대한 공동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말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나 해야 할까? 송정은, 조남규 씨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게 되었고, 지금의 송정은, 조남규 씨가 될 수 있었다.
“빨강 혼자서는 단지 빨강일 뿐이죠. 녹색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빨강다움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색이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돋보이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돋보이게 할 수 있었다.
글쓴이 조은수는 아산장학생으로, 현재 본지 학생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