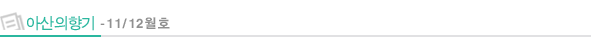|
 테마
테마 |
 테마 - 새삼스럽게 테마 - 새삼스럽게 |
이인환 |
|
|
 |
시멘트 포장이 낡아 군데군데 팬 길을 올라 고개를 넘자, 등 굽은 늙은 소나무가 보였다. 둥치 윗부분이 앞으로 휘어져 마치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곳에서는 고향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나는 그 소나무 아래 차를 세웠다.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매번 이 소나무 아래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이 길을 따라 10리 길을 걸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때가 30년 전이었다.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변했지만, 이 소나무만은 그대로였다. 물론 이 소나무도 30년의 세월이 비켜가지 않았을 터이므로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 눈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보였다.
초·중학교 때 아침 등교길에 지각하겠다 하며 뜀박질로 고개를 넘다가도 이 소나무 아래 다다르면 걸음을 멈추고 한숨 돌렸고, 간혹 저녁 어스름에 혼자 고개를 넘어올 때 뒤에서 머리 풀어헤친 처녀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아 오금이 저리다가도 이 소나무 아래에 오면 무서움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곤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서울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고향을 떠났지만, 10여 년 전까지 할아버지가 계셨고, 지금은 어머니가 내려와 계시는 바람에 설 추석 명절을 비롯하여 제사 등, 일년에 적어도 서너 번은 다녀가는 형편인데, 그때마다 나는 이 소나무 아래서 한동안 마을을 굽어보곤 했다.
초저녁의 마을은 고즈넉했다. 가을걷이도 다 끝나고 감나무에 한둘씩 매달린 까치밥이 유난히 붉게 빛났다. 서울을 떠나며 전화를 했으므로, 지금쯤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이 소나무 쪽을 살피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화로는 회사 일로 근처를 지나게 되어 잠시 들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오늘 점심 때까지 예정에 없던 귀향길이었다. 아들놈 문제 때문에 울화통이 터져 오전 내내 어금니를 질근거리고 있다가, 도저히 이대로 못 있겠다, 어머니한테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길을 나선 것이었다. 아니, 어머니보다는 이 소나무를 보고 싶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단 하나 둔 아들놈은 날이 갈수록 벗나갔다. 처음에는 컴퓨터 오락에 빠져 공부와는 담을 쌓는다고 야단을 치는 것으로 시작했다. 새벽 서너 시까지 오락에 매달려 있는 꼴을 보고 열 번이 넘게 주의를 주고 야단을 쳤으나,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컴퓨터를 뺏어버리자 이번에는 밖으로 나돌았다. 학교 간다고 아침에 나간 놈이 자정 전에 돌아오는 일이 별로 없었다. 학교 성적은 곤두박질쳤고, 제 엄마가 야단을 치면, 알았으니 그만 하라고 마주 소리를 질렀다. 보다 못해 내가 나서 으름장을 놓자 자기 인생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대들었다. 기가 막혀 몽둥이를 휘둘렀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 이틀인가 사흘 만에 제 엄마가 찾아나서 집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폭력을 쓰는 아빠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펄펄 뛰었으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대로, 우여곡절 끝에 내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양보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컴퓨터 오락으로 시작한 일이 학업 문제, 친구 문제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문제로 확산되었고, 나는 포기와 양보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애비의 위상을 위태롭게 지켜나가고 있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놈이 저 모양일까, 저놈도 인간일까 하는 생각에 기막혀 하다가,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만 참자 하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고 울화통을 터뜨리기를 반복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머리 염색한 꼴을 보고 한마디 했더니, 가타부타 말도 없이 돌아서며 픽 웃었다. 어이가 없다는 투였다. 순간적으로 욱하여 신발장에 있는 우산을 휘두르자, 힘으로 빼앗아 부러뜨려 버리고는 현관문을 걷어차고 집을 나가 버렸다. 나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집사람은 마루에 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등 굽은 소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도 효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 대든 적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좋은 아들이 될까, 아니, 적어도 아버지 눈밖에 나지 않는 아들이 될까 노심초사했다. 이 소나무가 잘 알 것이다. 아버지께 억울한 매를 맞고 이 소나무에게로 달려와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
나무에 기대서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내가 못난 탓이지. 자식이 애비 보고 배우는 법이지. 등 굽은 소나무가 가을바람에 버스럭거렸다. 그래, 등이 굽었어도 주변의 다른 어떤 소나무보다도 잘 컸네. 바로 자라도 제 인생이고, 삐뚜로 자라도 제 인생인걸.
나는 잠시 후 차를 돌려 길을 되짚어 나왔다. 좋은 일도 아닌데 어머니 마음까지 무겁게 해드릴 게 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고개를 내려와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 근처에 왔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그냥 갑니다 하고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웬 한숨이냐 물으시길래 아들놈 영철이 때문에 그러지요 했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성인군자도 어쩌지 못하는 게 자식 일이라고 했다. 영철이가 사춘기 아니냐. 철들면 잘 하겠지. 너도 에미 속 어지간히 태우지 않았냐.”
나는 흐흐 하고 웃었다.
“그러게요. 다 제가 못난 탓이지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새삼스럽게!”
글쓴이 이인환은 소설가이며 바둑평론가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