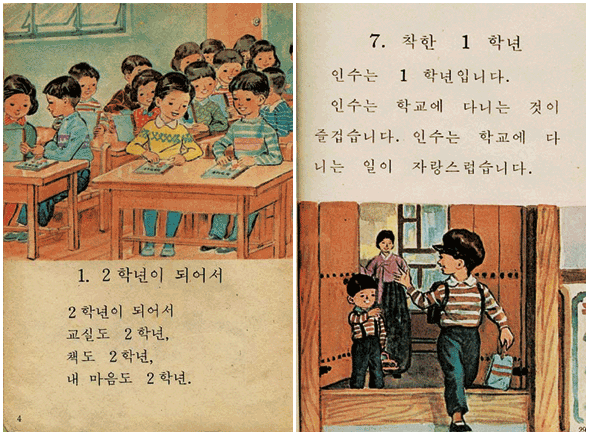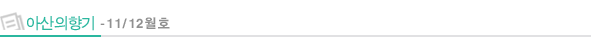
| 김영민 | |||
새삼-스럽다(─스러우니·─스러워서)(형) ①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도 새로운 일인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있다. 새롭다. - 그의 우정이 새삼스럽게 고마웠다. ② 지난 일을 이제 와서 공연히 들추어내는 느낌이 있다. - 새삼스럽게 그 일을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 새삼스러-이(새삼스레)(부) ‘새로운’에서‘새삼스레’로 새로운 것이라면 반성 없이 몰려드는 우리의 부박한 심성을 ‘새 것 콤플렉스’라 이름지어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첨단의 사상이나 기기(器機)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새 것 콤플렉스’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의 바이러스다. 가까이는, 지금 앉아 있는 방 안, 혹은 거실을 둘러보자. 그리고, 100년, 아니 그리 오랠 것도 없이 50년이라도 묵은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자. 어쩌면 10여 년 간의 손때 묻은 물건을 찾기도 쉽지 않을지 모른다. 새삼스레, 물건의 나이를 따져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 오히려 서식하는 낯설고 깊은 의미와 재미를 염두에 두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은 늘 ‘새삼스러운’ 삶의 가치를 은폐하거나 잊게 하기 때문이다. 비록 물건이라 할지라도 쌓인 시간만큼이나 사물화의 과정은 퇴화하고 다소나마 인간화하는 법이다. ‘페티쉬’의 긍정적 의미에서 볼 때, 사물은 인간의 벗일 수 있다. 무릇 동무 관계가 그러하듯, 사물과의 사귐에서도 오래 묵은 것은 발효의 열(熱)을 내장한다. 새 것이 과시하는 빛보다 낮고 느리지만, 깊고 오래가는 이치. 물론 ‘새 것’에 반응하는 기민함과 세련됨 역시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그러나 새 것이 오래된 것을 ‘보충’하지 않고 ‘대신’한다면, 우리의 근현대사처럼 옛것이 속절없이 청산된다면, 그것은 역사의 망실이자 상처에 다름 아니다. 역사 의식을 가진 자에게 어제는 깨끗이 ‘포맷’되지 않는다. 아무리 새로운 무엇이 현재를 덮어도, 과거는 ‘새삼스레’ 우리를 두드려 깨운다. 다시 말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보다 ‘새삼스레’라는 부사의 작용에서, 특히, 오래된 것이 새삼스러워지는 현상에서, 유형화-제도화한 배움이 놓치는 부분을 채울 것이라는 사소한 깨침. ‘거리두기’와 ‘낯설게하기’, 혹은 ‘다시 보기’의 일종인 ‘새삼스레’의 이치야말로 삶의 재미와 공부의 의미를 더해 준다. 그러나 ‘새삼스레’는 일없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매일 보던 TV가 ‘새삼스레’ 달리 보이거나,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이 ‘새삼스레’ 낯설어지는 것에는 미묘한 계기가 작동한다. 그 계기는 가깝고도 먼 곳, 바로 ‘나’ 속에서 발생하고, 기동한다. “내 언어의 끝이 세계의 끝”이라거나, “내 이성의 끝이 신성(神聖)의 끝”이라는 등의 언설은 관념론적이긴 하지만 사람과 세상이 조응하는 이같은 이치의 단면을 증거한다. ‘새삼스레’의 이치는 시간과 공간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마치 나이테처럼 묵혀진 시간은 공간 속에 어떤 ‘무늬’를 조형한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더불어 지내면 시간과 공간은 그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그 ‘흔적’은 닦아내면 사라져 버리는 ‘얼룩’이 아니다. 벗길 수 있는 ‘껍데기’는 더더욱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잘 대접받아 얻게 되는 무늬는 표층의 장식이 아니라 심층의 길이다. ‘인문학(人文學)이 사람의 무늬(人紋)’라 했던 것도 이런 뜻에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식의 무늬는 어느 날 우리에게 ‘새삼스레’ 나타난다. 침묵을 힘겹게 비집고 나오는 목소리, 다른 프리즘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안타까운 색조들, 시각과 거리를 바꾸고서야 드러나는 작은 얼굴들, 긴 시간의 무게를 느끼고서야 음각(陰刻)되는 지하의 이치들은 모두 ‘새삼스레’ 나타나는 삶의 무늬들인 것. ‘새삼스레’의 이치를 선용해볼 만한 곳은 적지 않다. (물론, 의식적으로 새삼스러워질 것을 종용하려는 태도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 이런 점에서 새삼스러움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탄다.) 우선, 버릇과 반복되는 일상이 무궁무진한 텃밭이 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일평생 되풀이하는 행위는 무서운 관성이지만, 무심하게 지나치기 마련인 버릇과 일상이 새삼스러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배움이자 재미일 터. 대단한 결심이나 과감한 실천 못지 않게, 사소한 일상과 버릇을 달리 보는 집요한 근성은 그렇지 않은 것과 분명 큰 차이를 벌려놓을 것이다. ‘새삼스레’의 형식에도 유념할 만하다. ‘새삼스레’를 포함한 부사의 이치는 메타적이기 때문이며, 특히 ‘새삼스레’라는 부사야말로 그 본성이 메타적이기 때문이다. 부사는 늘 문장에 총체적으로, 메타적으로 관여한다. 한자리에 붙박혀 있고, 더구나 교체되더라도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명사나, 그 명사를 꾸미거나 떠받치는 형용사, 조사와는 그 입지에서부터 다르다. 형용사와 대비해 보면 그 차이가 선명하다. 그 기량에 상관없이 형용사는 명사를 부풀리거나 치장하는 것에 그친다. 게다가 명사의 하부구조에 속하는 형용사와는 달리, 부사는 문장 전체에서 깨끗이 독립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은근히 영향을 미친다. 상식적이며 교과서적인 틀에 갇혀 안전하고 자폐적인 ‘명사’와, 그 명사에 의존하고 있는 ‘조사’에 비하면, 부사는 내가 늘 말하듯이 “독립하되 고립되지 않는” 품사이며, 나아가 ‘위험’을 감당하는 품사라 하겠다. 이런 부사 중에, 그 내용과 형식이 겹으로 메타적인 것이 바로 ‘새삼스레’이다. 그러므로 ‘새삼스레’ 뒤늦은 후회나, 때늦은 반성이 일어난다고 타박할 것은 없겠다. 때늦은 반성으로 일은 그르쳤을지언정, 적어도 ‘새삼스레’ 다가온 반성을 계기 삼아 나를 살찌울 수는 있을 테니. 글쓴이 김영민은 한일 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