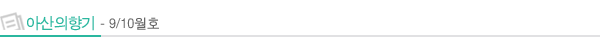|
남북어린이
아이들의 눈은 맑다. 아이들의 웃음에는 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향기가 있으며, 아이들의 눈물 방울은 눈물
많은 세상의 강력한 표백제이다. 아이들은 검게 그을린 얼굴에서도 그 빛을 뿜어내는 순수함과 진실함이라는
광원을 가지고 있다.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일이라는 깊고 어두운 해저 속에서, 남의 어린이나 북의 어린이나 모두 '어린이'라는 깨달음의 귀한 보물을
찾아 내었다.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이기에 어른들의 거대담론 속에 정작 통일의 세기를 짊어질
어린이들은 파묻혀 있던 것이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한 워즈워스의 통찰에 감탄하게 된다.
어깨동무
'서로 상대방의 어깨에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하고 노는 아이들의 놀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제쳐두더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어깨동무'라는 단순한 네 글자에 훈훈한 정과, 하나됨과,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담아 두고 있을 것이다. 단체의 이름에 대해서 묻자, "어깨동무라는 행동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순수한 마음과 평등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사무국장
박진원 씨는 말한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다름을 인정'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감과 같이, 이해득실을 넘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리하여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이름 그대로 '남북 어린이들이 어깨동무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1996년도까지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통일은 어른들의
정치적 문제, 복잡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 1996년, 북한에 큰 물 피해가 났다. 북녘의
많은 아이들이 먹지 못해 비참히 죽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아이들이 죽어간다는데, 우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그들을 움직였다.
어깨동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엇비슷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무엇을 지원하였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보냈다'고 한 대답은 북녘 어린이들을
품는 그들의 자세를 단번에 알아차리게 해 주었다. 대북 지원 사업과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화 교육
사업과 평화 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무지개다리=통일다리
하지만 남녘의 아이들은 누구에게 따스함의 손을 건네고 있는지 모르고, 북녘의 아이들도 전해지는 따스함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그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만나서 부둥켜 안을
수는 없지만, 같이 공을 차고 놀 수는 없지만, 서로의 얼굴과 소개를 그려 보냄으로써 우리는 '친구'라는
깨달음을 선물해 주었다. 프리즘으로 통과된 빛이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색을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
주듯이, 그림에 담겨 있는 서로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어깨동무함으로써 하나의 매듭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남녘과 북녘을 미리 연결해 주는 무지개다리는 만남과 하나됨에 대한 소망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
'통일이 되면 같이 백두산에 가보자.'
'그때까지, 앓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어느 곳에서나 수시로 터지는 핸드폰이 있는 요즘, 아무리 많은 기지국이 세워져도, 통화할 수 없는 북녘의
아이들과 남녘의 아이들이다. 같이 축구하고, 같이 백두산에 가보는 소박한 소망을 가진 아이들이다.
흥겨운 만남의 선율들이 지금 나의 귓가에 어렴풋이 들리는 것은 그림과 편지로 미리 나눈 만남을 통해
이미 그들은 손잡고 춤추며 어깨동무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들의 마음이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언젠가는…'이라는 무책임한 기대가 아니라 한 북녘아이의 말처럼 '어서 빨리…' 말이다. 만나서 놀고 싶을 때
전화하면 언제든 뛰쳐나올 수 있는 열린 만남의 터가 생기기를 바란다.
글쓴이 조은수는 아산장학생으로, 현재 본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